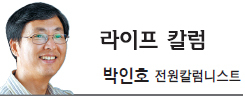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역시 시골이네!”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역시 시골이네!”단풍이 막바지 절정이던 지난달 하순, 강원도 산골의 필자 집을 찾은 몇몇 고교동창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하나같이 감탄사를 터뜨렸다.
다음날 오전, 인근 산행을 마친 뒤 주변에서 제법 알려진 식당으로 안내했다. 한 친구가 차림표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마디 했다.
“어, 시골 식당이 수도권의 유명한 막국수집 보다 더 비싸네.”
얼마 전 필자는 귀농ㆍ귀촌 강의 차 ‘대한민국 부자동네’ 서울 강남에 갔다가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맛있게 비운 콩나물국밥의 가격은 뜻밖에 5000원. 시골의 보통 식당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정갈한 반찬에 맛도 더 나았다.
시계를 몇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그러니까 필자가 귀농한 이듬해인 2011년 여름이었을 게다. 도시에서 온 한 지인과 강원 동북부 내린천변의 한 식당을 찾았다. 먹는 내내 그는 푸짐한 상차림을 칭찬하며 “정말 맛있다”를 연발했다.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오면서 그가 한 말은 “너무 (가격이) 싸다”였다.
이후에도 도시의 지인들이 찾아오면 ‘싸고 맛있는’ 그 식당을 즐겨 찾곤 했다. 하지만 불과 몇년 사이 “정말 맛있다”던 음식 평가는 “괜찮네” 수준으로 절하됐다. 가격이 싸다고 말하는 이도 없다.
시골 현지에서 파는 각종 농산물에 대한 도시인들의 반응도 엇비슷하다. 필자가 전해들은 말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다. “시골에서 파는 농산물이 되레 도시의 대형마트 보다 비싸다. 그렇다고 맛이 더 좋은 것도 아니다.”
최근 충청도의 한 지자체가 개최한 축제장에서 만난 몇몇 도시 관광객들은 이렇게 꼬집었다. “자연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산만 아니면 다행이지. 요즘 시골을 보면 예전의 인심은 온데간데없고 돈만 밝히는 것 같다.”
필자도 농촌으로 들어온 지 만 5년이 넘었으니 시골사람이다. 도시인들의 이런 일침이 듣기 불편하고 거슬릴 때도 있다. 그러나 별 대꾸를 하지 못하는 것은 필자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직접 농사를 짓는다. 사실 땀 흘려 가꾼 감자, 고구마, 옥수수, 고추 등을 내다 팔아봐야 별로 돈이 안된다.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농산물이 갖고 있는 가치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난달 28일 필자가 사는 지역에선 군 의원 재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농촌의 각종 선거를 지켜보면서 시골의 명예ㆍ권력욕 추구 또한 지나치다는 생각을 여러번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요즘 시골은 이렇듯 돈, 명예 등 도시의 가치에 무서운 집착증을 보인다. 그러다 보니 “시골이 (도시보다) 더 하네”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는 결국 도시 소비자들의 외면을 초래하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나마 “역시 시골이네”라는 감탄사가 남아 있는 것은 자연 뿐이다. 청정, 안식, 힐링 등 자연의 가치를 보존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이유다. 시골다움을 회복해야 시골의 가치가 올라가고 더불어 경제적 가치 또한 상승할 것이다. 시골이 무엇부터 추구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시골은 시골다워야 시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