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젠 유독 피곤했다.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을 타고 집에 도착하자 마자 거실 소파에 널브러졌다. 고등학교 1학년 딸 아이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을 내밀더니 난데 없이 질문을 던졌다.
어젠 유독 피곤했다.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을 타고 집에 도착하자 마자 거실 소파에 널브러졌다. 고등학교 1학년 딸 아이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을 내밀더니 난데 없이 질문을 던졌다.“아빠, 국가가 뭐예요?” “뜬금없이…. 국가는 왜?”
<국가란 무엇인가>란 책을 빌리고 싶었는데 손이 가질 않아 다른 책을 빌려왔다고 했다. 저녁 TV 뉴스는 온통 ‘최순실’ 얘기로 도배됐다. 최씨가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나는 딸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참담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낮 개인에 기대어 국정을 운영했다. 대통령의 영(令)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국가 운영 시스템은 사라졌고 대통령은 필부의 조롱거리가 됐다.
‘최순실이 누군데!’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국민은 ‘듣도 보도 못한 최씨 일가한테 왜 국정운영을 맡겨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 답해야 했다. 그냥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준 분이어서 청와대 보좌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 조언을 들었다’는 말로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 앞에 와 있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은 그 동안 국가를 걱정하는 박 대통령의 심정만큼은 믿으려고 애썼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결혼했다’는 말도 진정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애초에 ‘박근혜’를 신뢰하지 않던 사람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찍은 50% 국민은 그랬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고비를 못 넘어 선진국이라 불리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초심을 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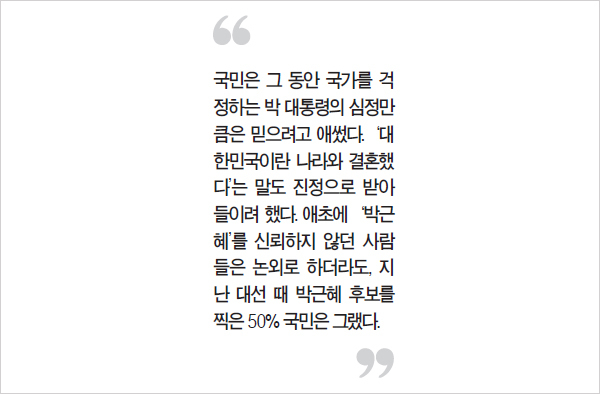
후보 시절 ‘박근혜’는 ‘이명박’ 처럼 ‘747공약(성장률 7%,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같은 달성 불가능한 숫자를 늘어놓지 않았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당선 소감 일성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박근혜 선거캠프 이름도 ‘국민행복캠프’였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국민행복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 흔한 위원회 하나 만들지 않았다. ‘국민행복위원회’ 같은 것 말이다. 그냥 말로만 던졌다. ‘국민행복’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이상한 정책구호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의 철학을 잃어버렸다.
철학이 없는 정권 속엔 반드시 ‘권력의 사유화’란 이름의 괴물이 태어난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에서 인간의 야만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야후’ 같은 괴물 말이다. “야후는 대자연이 만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시끄럽고, 가장 기형적이고, 가장 길들이기 어렵고,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가장 악랄하다. 그들은 암소의 젖꼭지를 몰래 빨아 먹고, 귀리밭과 풀밭을 짓밟아 버리고, 기타 수천 가지의 악행을 저지른다.” 야후에 대한 조나단 스위프트의 정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