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해고 쉽게 해 제조업 강국 부상유로화 업고 수출 확대 막대한 흑자 유지그리스등 적자국에 가혹한 재정규율 압박유럽의 안정·균형 위협하는 존재 우려감
노동자 해고 쉽게 해 제조업 강국 부상유로화 업고 수출 확대 막대한 흑자 유지
그리스등 적자국에 가혹한 재정규율 압박
유럽의 안정·균형 위협하는 존재 우려감
‘과거로의 회귀’는 군국주의화하는 일본에 한정된 얘기만은 아닌 듯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 독일을 향한 유럽연합국들의 시선은 ‘독일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의심의 눈초리다. 다만 독일은 총 대신 경제력을 무기로 삼은 게 다르다.
영국 버밍엄대 독일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자 독일 마셜 펀드의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일문제전문가 한스 쿤드나니는 ‘독일의 역습’(원제:The Paradox of German Power‘)에서 최근 그리스 사태와 유로화 위기에서 독일이 보여준 강경한 대응방식을 통해 독일의 속뜻을 적나라하게 파헤친다.
 |
| 독일의 역습. (한스 쿤드나니 지음, 김미선 옮김, 사이) |
저자는 이 책에서 1990년 동서독 통일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경제적으로 휘청거리며 ‘유럽의 병자’로까지 불렸던 독일이 어떻게 해서 제조업을 부활시켜 짧은 시간에 경제강국으로 탈바꿈했는지 보여준다. 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제도개혁으로 불린 ‘어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안’ 등이 독일의 경쟁력 강화에 끼친 영향과 부작용, 그리스 같은 EU 주변부 국가들에게 잔인하고 가혹하리 만큼 엄격한 재정 규율을 밀어붙이는 숨겨진 진짜 이유 등을 들려준다.
2008년 미국의 리먼 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각국의 경제를 마비시켰다. 그런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림이 없던 나라가 독일이다. 영국과 미국이 금융산업에 치중할 때 독일은 제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펼친 결과라는 평가가 따랐다. 저자는 이런 ‘독일의 힘’은 독일이 자국의 우선순위를 다른 유로존 국가들에게 밀어붙이기 위해 유례없이 강한 경제적 힘을 사용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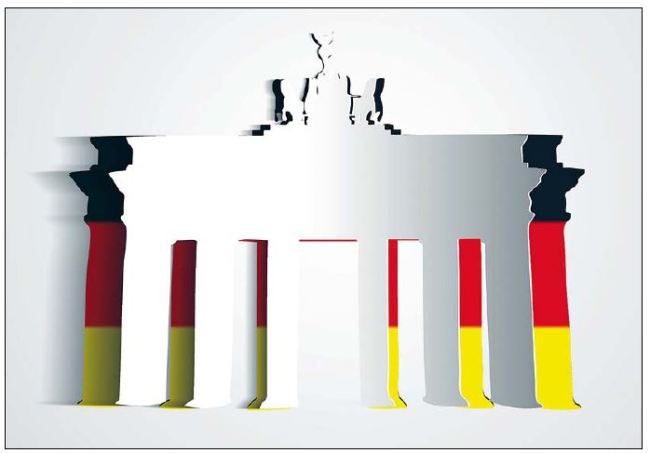 |
| “유로존 위기가 발발하고 나서 독일이 수출한 것은 규율이었지 규범은 아니었다. 많은 유로존 국가들은 그 규율이 독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지에 몰리고 나서야 마지못해 독일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자주 보인다.”‘(독일의 역습’ 중) |
그 중심에 ‘어젠다 2010’, ‘하르츠 개혁안이 있다. 페테 하르츠가 주도한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소규모 업체도 손쉽게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일 노동자의 단위노동 비용을 줄인 것이다. 이는 통일 이후 경제 위기 속에서 허덕이던 독일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게 된다. 독일은 저렴해진 노동 비용 덕에 유럽 국가들에 비해 가격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하락했다. 실질소득은 4.5퍼센트 떨어졌고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저임금과 임시직으로 연명하는 새로운 하위계층이 생겨난 것이다. 2010년 독일의 수출호황기에 독일 노동자들은 거의 혜택을 입지 못했고, 독일의 내수 부진은 더욱 가속화한다. 더욱 더 수출의존형 경제시스템이 돼 버린 것이다.
이는 마르크화보다 약세인 유로화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대신 그리스 등 무역수지 적자 국가들이 그 짐을 떠안게 됐다는 게 저자의 논리다. 그 결과 흑자국과 적자국간의 불균형은 심해지고 EU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불균형과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렀다.
강한 독일의 재탄생은 아니러니하게도 독일 경제를 약화시킨 ‘베를린 장벽 붕괴’에 닿는다. 1989년 독일의 통일은 영국과 프랑스의 불안을 키웠다. 영국 수상 대처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거대해진 독일이 유럽의 안정과 균형을 깨트릴 것을 염려해 유럽통합에 적극 나섰다. 미테랑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의 경제적 주권을 확보하는 최선의 길은 ‘단일 통화’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미테랑 대통령은 단일 통화에 확신을 갖고 “공동의 통화가 없다면 영국이나 우리 모두 벌써 독일의 야욕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 것”이라고 대처에게 말했을 정도다. 독일의 국력이 강해져 주변국을 위협할 것을 우려해 유로화라는 형태로 독일을 유럽의 공동체 일원으로 잡아두려 한 것이다.
저자는 독일문제 해결에 유로화는 악수였다고 평가한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유럽지도자들이 위기를 감당할 능력도 없고 현실적인 정치 협력과도 상관없는 단일통화 체제를 출범시켰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10년 동안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였던 유로화는 경제학자 마틴 펠드스타인의 예측대로 유럽 내에서 갈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독일이 주도하는 EU는 한층 엄격한 규율과 강화된 규정을 도입하는 등 더 강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로화 위기에서 태어난 것은 체벌과 징계, 규율,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의 ‘우울한 통합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총구를 들이댄 통합체”라고 말한다.
저자의 대안은 독일의 ‘힘빼기’다. 독일의 극적인 경제호전과 반작용으로서의 유럽의 갈등은 독일 내수가 부진한 상태에서 높은 수출의존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독일의 경쟁력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즉 유럽의 사태는 독일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 않고 주변국들의 디플레이션만 만들어내는 독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에서 독일은 거꾸로 유럽의 적자 국가들에게 보다 큰 경쟁력을 갖추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1871년 독일의 첫 통일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갈등을 흔히 ‘지정학적 딜레마’로 부르는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유럽문제는 ‘지경학적(geo-economic) 딜레마’로 설명된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독일 문제를 저자는 한마디로 압축한다.
“이제 관건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력이라는 무기를 더욱 가혹하게 휘두를 것인가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